발달심리학 2 청년기
청년기의 심리
이 시기는 '자신을 찾는'시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어떤 진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한 마디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진학이나 취업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자아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야말로 독특한 존재이고, 현재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장래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정체성 확립입니다.
자신이 도데체 누구인가 라는 고민은 경험에 본 사람에게는 매우 쉽게 공감되는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진학이나 취업의 고민은 이해해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고민은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중년기, 노년기에 정체성 위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 오기도 하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은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자아 찾기는 단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의 자아 찾기는 공부, 동아리활동, 놀이, 연애, 갈등 등 여러 가지를 체험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또 자아를 찾았다고 해도 자신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느끼고 좌절하는 것은 진정 자아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아정체성은 주변 사람,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 자신의 가치에 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자신은 가치있는 인간이다 라는 자아 존중감(Self Esteem)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엄(Psychosocial Moratorium )
자아정체성 확립을 미루는 것을 심리적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도 합니다. 모라토리엄 인간이라고 하면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이 생각을 처음 거론한 에릭슨은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성숙되고 풍부해 졌기 때문에 청년기(학생 시기)가 길어져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를 생각하거나 시험해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보다 확실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자체는 나쁜 것을 아닙니다만 현재의 모라토리엄(아래 글 참조)은 옛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가지 역할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떠 안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 가급적 회피하고 모라토리엄 상태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인간(Moratorium 人間)
언제나 사회적 자아(identity)를 확립하기 위한 모라토리엄에 머무를 뿐, 기성 성인사회의 한 주체가 되지 못한 인간을 말한다.
에릭 홈버그 에릭슨은 모라토리엄을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지적·육체적·성적인 능력면에서 한 사람 몫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지불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1960년대부터 이런 의미에서의 모라토리엄인 청년기가 점차 연장돼 모라토리엄 상태에 머무는 청년층이 늘어났다.
이처럼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지 못한 심리구조를 가진 사람을 모라토리엄 인간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비단 청년층뿐만 아니라 각 연배·계층에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현대시사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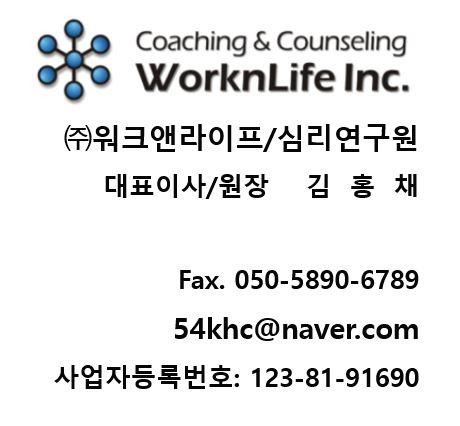
 Rss Feed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