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첫인상이 가장 중요 --대인지각
우리들은 매일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으면서 ‘A는 시원시원한 사람’ ‘B는 까다로운 사람’ ‘C는 따뜻한 사람’ 이라고 하는 등 사람에 대하여 나름대로 인상(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얼마간의 정보, 예를 들면 ‘A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A는 큰 소리로 인사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조합하여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그 사람에 관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인상형성]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정보라도 받아들이는 순서에 따라 인상이 변한다]
어떤 사람에 관한 정보로서 7개의 형용사를 읽어 주고 실험참가자가 그 사람에 대해 형성한 인상을 검증하는 실험이 있습니다(Asch, 1946).
INTELLIGENT, SKILLFUL, INDUSTRIOUS, WARM, DETERMINED, PRACTICAL, CAUTIOUS 라고 하는 7개의 형용사를 들은 참가자와 INTELLIGENT, SKILLFUL, INDUSTRIOUS, COLD, DETERMINED, PRACTICAL, CAUTIOUS라고하는 7개의 형용사를 들은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warm과 cold 2개의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6개의 형용사 모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관대한-속이 좁은’, ‘현명한-현명하지 않은’ 등 대응이 되는 18개의 인상을 나타내는 단어 중 그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에 적합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warm을 포함한 형용사를 들은 실험참가자들이 cold가 포함된 형용사를 들은 실험참가자들 보다 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현명한’ ‘행복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warm, cold라고하는 형용사가 그 외 6개의 형용사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럼 warm과 cold라는 형용사를 제외하고 단지 6개의 형용사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6개의 형용사를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의 순서로 ‘지적인, 부지런한, 충동적인, 비평적인, 고집센, 부러워하는’이라고 들은 참가자와 반대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의 순서로 들은 참가자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긍정적인 형용사부터 들은 쪽이 부정적인 형용사를 들은 쪽보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같은 정보라도 획득한 순서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 얻은 정보가 나중에 얻은 정보보다 인상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으려면]
이처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 중에서도 특히 먼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대충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첫 대면에서 자신의 훌륭한 점(warm)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꾸로 평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첫 대면에서 냉정한(cold)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버리면 그 다음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효과(primary effect)라고 합니다.
애쉬(Asch, 1946, 270-273)는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을 묘사한 6개의 형용사를 순서만 바꾸어 제시한 실험을 통하여 형용사의 제시 순서 차이가 그 사람의 이미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성격 특성들을 묘사한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고집이세다’ 등 6개로 이루어진 단어의 리스트를 제시한 다음, 피실험자로 하여금 제시된 리스트를 보고,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에 대한 인상을 말해보라고 하였는데, 한 집단에게는 ‘지적이다’와 같이 성격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고집이 세다’와 같이 성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단어를 맨 뒤로 배열한 리스트를 주고, 나머지 다른 한 집단에게는 단어의 배열 순서를 그와는 정 반대로, 즉 ‘고집이 세다’와 같이 성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단어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성격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단어를 맨 뒤로 배열한 리스트를 주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단어가 먼저 제시된 리스트를 본 집단은 리스트가 묘사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제시된 리스트를 본 집단은 리스트가 묘사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의 리스트는 동일한 6개의 단어를 나열하고 있으며 차이는 단지 배열순서뿐이지만, 독자들이 리스트의 정보를 읽고 해석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배열순서’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최인철(2007, 59)은 시간상으로 앞서 제시된 정보들이 뒤따라오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이젠버그와 배리(Eisenberg & Barry, 1988)도 순서 효과(order effect)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2개 군의 피실험자들에게 사전에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query)을 읽게 한 다음, 질문지와 관계 있는 문서의 요약문(document description) 15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질문지와 얼마나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7급간 척도로 평가(rating)하게 하였다. 이 2개의 피실험집단 중에서 1개 집단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요약문부터 제시한 다음 낮은 요약문을 제시하였고, 다른 1개 집단은 그 역의 순서로 문서 요약문을 제시하여 각각의 요약문에 대한 관련성 지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이 두 집단이 내린 평가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질문지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부터 높은 요약문- 103 순으로 제시한 집단이 관련성이 높은 요약문부터 제시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저자들은 피실험자가 관련성이 낮은 요약문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내용과 문서 간의 관련성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을 갖는 반면에, 역의 순서, 즉 관련성이 높은 요약문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에는 피실험자들이 질문내용과 문서간의 관련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Eisenberg & Berry, 1988,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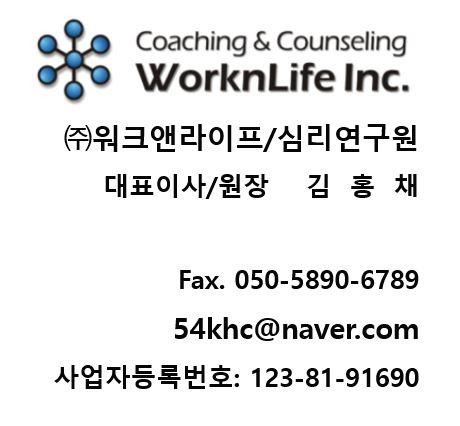
 Rss Feed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