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 곤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까 말까는 그 외 다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 이외에 도움에 나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때의 기분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기 힘들다]
우선 중요한 요인은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장소에 다른 여러 사람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여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통해 알아낸 것은 그 장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혼자 또는 둘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방안에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연기를 알아차릴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보았더니 혼자서 작성할 때는 5초 이내에 알아차렸습니다만 둘이서 작성하고 있었을 때는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있으면 주의가 그 밖의 다른 것에 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또 세 사람이 그룹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기가 스며 들었다는 것을 보고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기를 알아차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침착하게 있으면 자신만이 소란을 떠는 것은 안 좋다 라든지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은 연기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긴급사태에의 대응이 늦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실험에서, 여성이 별실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던 학생은 자기 혼자 있었을 때는 70%가 도우러 갔습니다만 두 사람일 경우는 40%밖에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때에는 실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곤란을 당한 사람을 도우러 가는 책임은 자신 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우러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책임의 분산’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실제 실험참가자가 내부 전화로 통화 중이던 상대방이 대화 도중에 발작을 일으켜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쳤을 때 자신 만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은 학생은 85%가 도우러 갔습니다만 자신 외에 네 명이 듣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진 학생은 31%밖에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도움을 청하라
이처럼 함께 있는 사람이 많고 더구나 그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행동이 일어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책임분산’이 일어나기 어렵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만원 전철 안에서 속이 안 좋아졌을 때, 속이 안 좋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알아차려 도와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확실하게 속이 안 좋은 것을 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행동에 편승한다]
다른 사람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도 돕게 됩니다. 어느 야외 실험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나서 곤란해 하고 있는 여성운전자를 보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여성운전자를 돕고 있던 것을 본 사람일수록 여성운전자를 돕게 된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이 도움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면 좋겠지요. 연말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 옆에서 성금을 모금하면 더 유효하겠지요.
[상황에 맞는 구조요청이 필요]
또 인간은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공짜로 경품을 받아 기분이 좋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밖에 남성보다도 여성이 도움을 받기 쉽고,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하기 쉽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게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움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도박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거의 도움을 받을 기대를 하지 못하겠지요.)
[참고]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수록 어떤 한 개인이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적으며, 또한 도움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도 더 긴 현상.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책임의 분산과 상황의 모호성 등이다.
책임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다른 누군가가 행동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러한 가정은 종종 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가를 설명한다.
[참고]
키티 제노비스 사건(Murder of Kitty Genovese)은 1964년 3월 13일 뉴욕 주 퀸스에서 캐서린(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강간 살해당한 사건으로,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뉴욕 주 퀸스 지역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여성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야간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새벽 3시쯤 한 수상한 남성에 의해 자상을 입는다. 제노비스는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였고, 아파트에 살던 동네 사람들은 불을 켜고 사건을 지켜보았다. 제노비스를 살해한 범인인 모즐리는 후에 법정 진술에서 집집마다 불이 켜졌지만 사람들이 사건 장소로 내려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했다. 갑자기 불을 켜고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사건 장소로 오지 않는 대신 "그 여자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모즐리는 바로 도망을 쳤고, 제노비스는 난자 당한 몸을 이끌고 어느 가게 앞으로 드러누웠다.[2] 그러자 모즐리는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의 온몸을 난자했다. 제노비스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또다시 아파트 불이 켜지자, 모즐리는 또 도망을 갔다. 제노비스는 힘겹게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복도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모즐리가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를 강간했다. 이 살인사건은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일어났다. 집에 불을 켜고 제노비스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총 38명이었고, 그들은 직접 사건 현장으로 내려가 제노비스를 구출하지 않았다. 사건이 끝나고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녀의 목숨은 이미 끊겨 있었다.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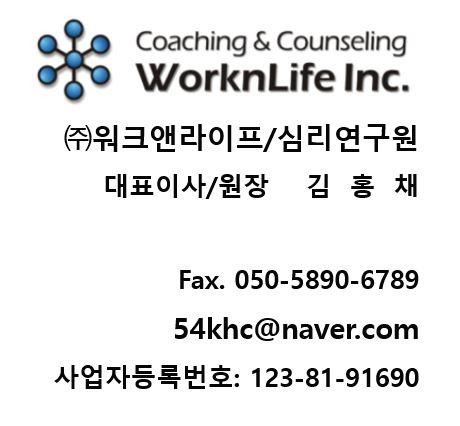
 Rss Feed
Rss Feed